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당시 나는 친구를 사귀는 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조용한 아이였다. 학교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었다.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우리 반 반장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극성스러운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좋게 말해 그 애는 무척 명랑했고, 조금 감정을 섞어 이야기하면 아주 산만하고 까불까불했다. 그런데 용케 수업시간에는 태도가 의젓해서 선생님의 지적을 받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그 애와 나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곤 나는 내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집에 올 때면 신기하게도, 항상 그 애를 마주쳤다. 친구와 함께 있거나 혼자 있거나 상관없이 그 애는 어디선가 나타나 양쪽으로 묶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도망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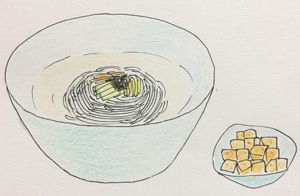
그날은 비가 왔다. 나는 우산이 있었고, 그 친구는 없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학교 현관 앞은 우산을 가져온 부모들로 북적거린다. 아마 그 친구의 우산은 그 중에 없었나보다. 나는 그 애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갈 생각은 못했다. 나를 또 괴롭히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그 애는 비를 맞으며 나와 조금 떨어져 걸었다. 한참 걸어도 내 머리를 잡아당기진 않았다.
집에 오고 난 뒤 비가 그쳤다. 대문 밖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애였다. 왜 우리 집에 왔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당황한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 애의 등장은 뜻밖이었던 것 같다. 얼떨떨한 나를 대신해 엄마가 그 친구를 반겼다. 마침 오전 교대근무를 마치고 집에 온 아빠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엄마는 편하게 먹으라며 그 애와 내게 특별히 상을 따로 차려줬다. 상에는 잔치국수 두 그릇과 깍두기가 올라가 있었다.
길에선 극성스럽게 나를 괴롭히던 것과 달리, 내 방에 들어온 그 애는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었다. 잔치국수를 먹으며 그 애도 나도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조용하던 그 순간 그 애가 깍두기를 씹었다. 주사기로 쏜 듯 깍두기에서 국물이 가늘게 쭉 뻗어 나와 내 얼굴로 튀었다. 잠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조용히 남은 국수를 먹었다.
이날 이후로도 우린 그리 친하지 않았다. 길에서의 실랑이만큼은 학년이 바뀔 때까지 이어졌다. 나중엔 나도 울지 않았다.
장마철이 되면 이 기억이 떠오른다. 나는 왜 이 일을 잊지 못할까. 내 얼굴에 튄 깍두기 국물 때문일까. 누군가를 좋아할 줄도 모르고, 그런 감정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건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수줍어하지도, 얌전하지도 않은 왈가닥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 친구도 그랬을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이 글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심혜진 시민기자
sweetsh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