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치맥’(치킨과 맥주)이 유행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치밥’이 인기다. 치킨을 먹고 남은 소스에 밥을 비벼먹는 것이 치밥의 정석이다. 최근 매콤한 소스를 더한 새로운 치킨 메뉴가 속속 등장해 치밥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다.
나는 치킨 때문에 채식주의자 되기는 글렀다고 생각할 정도로 치킨을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치킨을 먹고 있으면서도 치킨이 먹고 싶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치킨이 생각난다. 도무지 질리지 않는다.
이런 내게 치밥 열풍은 참 뜨악했다. ‘그게 뭣이 새로운디?’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마도 내 생애 치킨을 처음 마주했을,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1980년대의 어느 날부터 나는 치킨과 밥을 함께 먹었을 것이다. 치킨을 상 가운데 놓고 옆엔 김치 그릇도 놓고 밥그릇에 밥을 퍼준 엄마는, 바로 우리 집 치밥의 창시자다. 일 년에 두세 번 먹을까 말까 한 치킨이었지만 그때마다 치킨은 늘 밥과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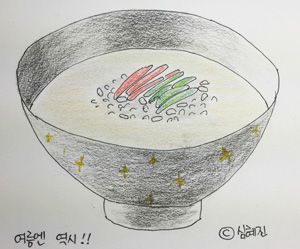
그러니 갑자기 불어 닥친 치밥 열풍이 반가운 한편, 그동안 받아온 구박의 기억도 함께 되살아난 것이다. 요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 치킨 소스에 밥을 신나게 비벼 먹으며, 자유인이란 이런 것임을 만끽하는 중이다.
30년 앞서 치밥 콜라보를 실행해온 나로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지금은 정서상 금기인 콜라보가 또 있으니 말이다. 다들 콩국물엔 국수만 말아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겐 콩국물엔 역시 따끈한 밥이 최고다. 이 또한 여름마다 콩국물을 큰 통으로 하나 가득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 두고 밥 때마다 국그릇에 콩국물을 퍼주신 엄마의 영향이 크다.
콩국물은, 콩을 삶는 것이 성패의 90%를 좌우한다. 엄마의 이야기론, 콩을 덜 삶으면 콩 비린내가 나고, 너무 삶으면 메주냄새가 나서 구수하지 않다. 나머지 10%는 콩을 어느 정도 곱게 가느냐에 달렸다. 이건 식성에 맞게 조절하면 되는 일이다.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강물 맛을 기억하듯, 나도 여름만 되면 콩국물을 찾는다. 1인분씩 포장해 놓은 것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고 밥을 말아 먹는다. 오이와 파프리카를 채 썰어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 이번 여름엔 더위가 심해서인지 유독 콩국물을 많이 먹었다. 이번 달 가스비가 7000원 나온 걸 보고는, 요사이 굽고 끓이고 볶는 요리를 정말 안 해먹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이 더위에 가스레인지 앞에서 음식을 한다는 건 정말 고역 중의 고역이다.
동시에 엄마의 콩국물이 떠올랐다. 한 여름, 커다란 솥에 콩을 삶으며 정확한 타이밍에 콩을 건지기 위해 불 앞을 지키고 서있던, 땀범벅인 엄마의 얼굴. 콩 한 국자를 갈고 나면 모터가 뜨거워져 몇 분은 쉬어야 다시 돌아가는, 오래된 믹서기를 탓하던 엄마의 등은 땀에 젖어 있었다. 이렇게 만든 콩국물은 여름 내내 밥과 함께 후룩후룩 우리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엄마는 음식하며 흘리는 땀을 조금 덜 수 있었으려나.
앞으로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길어질 거라고 한다. 사람들은 콩국수를 더 찾게 될 테고, 콩국물은 더 잘 팔릴 것이다. 국수를 먹다 지치면 남은 콩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콩국물에 만 밥의 달큰하고 고소한 맛에 눈을 뜬 나머지, 그동안 왜 국수만 말아 먹은 건지,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다. 치밥의 날도 왔는데, 콩국‘밥’의 날이 오지 않을 거라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분명, 그날은 온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심혜진 시민기자
sweetsh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