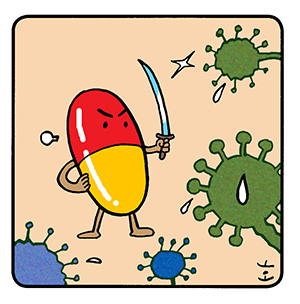
결국, 몸져누웠다. 감기도 아닌 것이, 목이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 병원에 가니 후두염이라고 했다. 후두는 목구멍의 일부인데, 말을 하고 숨을 쉬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란다. 의사는 약 몇 가지와 함께 항생제를 처방했다. 항생제만큼은 웬만하면 먹지 않겠다는 것이 평소 내 생각이었다. 증상은 딱 감기몸살인데, 이것 때문에 과연 항생제를 먹어야하는 건지, 많이 고민했다.
항생제를 인위적으로 가공한 약품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항생제는 미생물의 분비물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홍역이나 콜레라, 폐렴, 이질은 걸리면 대부분 죽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리는지 알지 못했다. 나쁜 공기 때문이거나, 신이 내린 벌이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린 것으로 생각했다. 180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것이 너무 작아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있는 생물, 즉 미생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생물의 ‘미’는 작다(微)는 뜻이다.
인간이 최초의 항생물질을 발견한 것도 미생물의 존재를 인정한 후의 일이다. 영국의 알렉산더 플래밍이라는 미생물학자는 실험접시에 미생물을 키우며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데 관심이 많았다.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자연 상태의 물질을 찾을 수만 있다면 병에 걸린 사람을 부작용 없이 낫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1928년 여름날, 플래밍은 포도상구균이 퍼져 있는 실험접시를 열어 놓은 채 휴가를 떠났다. 집에 돌아와 실험접시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는 접시에 난 데 없이 푸른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푸른곰팡이 주위로 마치 도려낸 것처럼 자신이 기르던 포도상구균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직감했다. 푸른곰팡이의 어떤 물질이 균을 죽인 것이라고. 결국 그는 실험으로 이를 밝혀냈고, 푸른곰팡이에서 나온 이 항생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푸른곰팡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마침 플래밍의 집 아래층엔 곰팡이를 연구하는 이가 살고 있었다. 이런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 아래층에서 기르던 곰팡이와 위층에 살던 세균이 만난 덕분에 지금 우리는 뱃속을 열어 수술을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콜레라나 페스트, 이질과 같은 세균성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인간의 삶과 문명이 이렇게 작은 우연에 기대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야말로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날 나는 항생제 한 알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다. 목 안의 염증이 어서 낫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는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열과 기침과 콧물이 동시에 나를 공격했다. 아니,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 항생제까지 삼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항생제는 몸 안의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는다.
내 몸의 면역과 관계된 좋은 세균까지 항생제가 싹 먹어치운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창궐한 건 아닐까. 바이러스는 세균 잡는 항생제도 어쩌지 못하는, 그야말로 중2 반항아 같은 존재이니 말이다. 나는 항생제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심혜진 시민기자
sweetsh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