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이맘 때 ‘사소한 과학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로 첫 글을 쓸까 한참 고민했다. 나는 ‘황사’에 대해 쓰기로 했다. ‘미세먼지’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던 때였다. 황사 자체보다 그에 섞인 중금속 물질이 문제라는 이야기와 함께, 황사를 몰고 오는 편서풍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글을 쓴 기억이 난다.
2년 뒤인 2013년 12월, 나는 베이징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서툰 영어로 상황을 파악해보니 인천에 황사가 심해 인천행 비행기는 모두 무기한 대기 중이라고 했다. 눈이 따끔거릴 만큼 뿌연 베이징 공항 공기를 여섯 시간 동안 마신 후에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도착해보니 인천공항은 정말 지독한 밤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며칠 뒤인 12월 16일부터 환경부와 기상청은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했다. ‘미세먼지’가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첫 번째 사건이다.
불과 5년 사이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왔다. 아니, 우리 폐 속에 깊이 들어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다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찌꺼기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1/7 정도다. 입자가 2.5㎛ 이하(머리카락 굵기의 1/30)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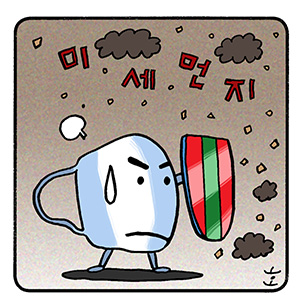
이것은 기관지에 촘촘히 돋아 있는 섬모의 움직임으로 인두라는 곳에 모인다. 인두는 입안과 식도 사이의 공간, 목젖 뒷부분이다. 인두에 모인 이물질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론 삼켜지기도 한다. 이것이 가래다. 그런데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는 섬모에서 걸러지지 못한 채 곧장 허파의 꽈리(폐포)까지 깊숙이 들어간다. 그리고 허파꽈리의 모세혈관을 따라 뇌ㆍ심장 등, 우리 몸 곳곳으로 흘러 다닌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엠아이에프(MIF)라는 단백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기능을 방해한다. 면역기능을 못하게 되면 비염이나 기관지염 등, 몸의 염증이 증가한다. 또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돼 허파꽈리에 들러붙은 중금속 물질이 늘어나면 결국 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뿐만 아니라 폐암ㆍ치매ㆍ동맥경화ㆍ기형아 출산 등, 안 좋다는 병은 죄다 미세먼지와 관련이 깊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평소보다 더 몸이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당장 예방법도 치료법도 없다. 일상에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중국 탓만 할 수도 없다. 미세먼지의 절반은 국내산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니 석탄을 마구 사용하는 발전소와 유해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에 경고를 보내야한다. 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이를 공기 정화 등, 환경을 위해 사용하게 해야 한다. 외출할 땐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는 식물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벵갈고무나무와 산호수가 특히 효과가 탁월하다니 참고하면 좋겠다.
심혜진 시민기자
sweetsh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