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지인이 갤러리를 겸한 커피숍을 열었다. 축하하는 마음에 곽휴지를 사들고 들렀더니, 직접 덖은 우엉차와 함께 말린 오렌지를 내왔다. 바나나 말린 것은 많이 보았지만 오렌지는 처음이었다.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오렌지의 색감과 달고 새콤한 맛은 그대로인데 바삭함이 더해진 것이다. 식감이 신기해 말린 오렌지에 자꾸 손이 갔다. 맛에 비해 만드는 법은 간단했다. 오렌지를 얇게 썰어 식품건조기에 여덟 시간 동안 말리면 된다. 높은 온도의 바람으로 오렌지의 수분을 완전히 날리면 바삭한 오렌지칩이 탄생하는 것이다.
바삭한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자나 구운 김을 일부러 눅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바삭한 음식의 최고봉은 튀김이다. 밀가루나 전분에 물을 넣어 반죽한 튀김옷을 속 재료에 입혀 끓는 기름에 넣으면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다. 속 재료는 익지도 않았는데 겉만 홀라당 타버리거나 때론 눅눅한 튀김이 되기도 한다. 바삭한 튀김은 축축한 튀김옷의 수분을 얼마나 빨리, 제대로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튀김옷의 두께와 기름의 온도,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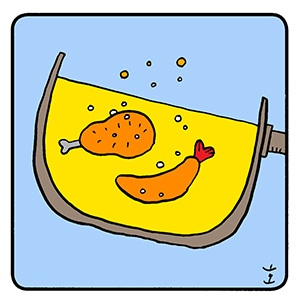
튀김 재료가 기름에 들어가면 기름의 온도가 내려간다. 수분이 날아가기도 전에 재료가 먼저 익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튀김옷은 최대한 얇게, 기름 온도는 170에서 180도 사이로 맞추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한 번 튀긴 것을 잠시 후 다시 한 번 튀기면 더 좋다. 속 재료가 익을 때 나온 수분까지 날려버려 바삭함의 끝을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삭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일까. 문화인류학자 존 앨런의 책 ‘미각의 지배’(미디어 윌 펴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인류의 조상들이 오랜 기간 야생에서 살아온 경험이 우리 뇌에 축적돼있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먼 옛날 그들이 좋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그들이 야생에서 찾을 수 있었던 바삭한 음식이란? 바로 곤충과 신선한 채소다.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가게에 가면 번데기 통조림을 구할 수 있다.) 바삭한 식감을 내는 것은 곤충의 표면을 덮고 있는 키틴이라는 물질이다. 언제 잡을지 모를 동물에 비해 곤충은 쉽고 흔하게 구할 수 있다. 게다가 지방과 단백질 등, 영양소도 풍부하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막 수확한 채소는 또 얼마나 아삭거리는지.
시간이 흘러 불을 사용하게 된 인류는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맛의 혁명에 빠진다. 음식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반응해 수백 가지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마이야르 반응이라 한다. 부침개의 가장자리나 삼겹살의 표면이 안쪽보다 더 맛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반응 때문이다. 질긴 근육과 억센 채소가 부드러워져 이전엔 먹기 힘들던 부위까지도 섭취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풍부한 맛에 바삭한 식감까지 얻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 ‘바삭’이란 단어가 열한 번 들어갔다. 바삭한 걸 먹고 싶다. 동네 치킨집 전화번호에 눈길이 간다. 몸에 그다지 좋지 않은 치킨, 하지만 맛있는 치킨,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도 난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심혜진 시민기자
sweetsh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