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심혜진 시민기자│어릴 적 부모님은 “너랑 혜민이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괄괄한 나와 달리 남동생은 조심스러운 성격에 말투도 상냥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동생을 태권도학원에 보내 ‘강인한 남자애’로 키우려 했지만, 절대 가지 않겠다며 울며 비는 동생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부모님은 성별에 따라 성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동생이 여자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성격과 같은 젠더는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생식기관으로 성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명쾌한 기준은 아니다. 오래 전 대학에서 ‘법과 사회’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나이 지긋한 교수님은 세상에 성별이 여성, 남성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다고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려 애썼지만, 양성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둘 다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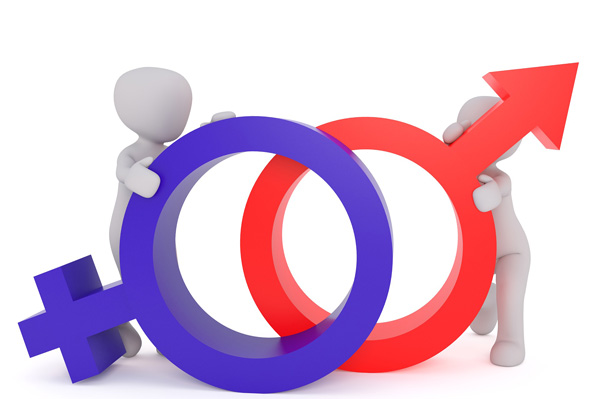
교수님은 여기에 중성과 무성을 덧붙였다. 중성은 생식기관이나 성적 특징으로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무성은 성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다.
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물의 특징이라 했다. 아무리 생식기관으로 남성과 여성을 또렷이 구분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도 ‘예외’가 존재한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성적인 특징은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 최초 난자와 정자가 만나 만들어진 배아에는 남자/여자 생식기 구조가 모두 존재한다. 약 7주 후 둘 중 한 구조가 사라지면서 나머지 하나의 생식기 구조가 남아 발달되고, 그것이 성별이 되곤 한다.
100년 전엔 염색체가 성별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여자는 X 염색체 2개, 남자는 X와 Y가 1개씩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데 X 염색체가 3개인 사람도 있고, X 2개나 3개에 Y가 1개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모두 여성이나 남성으로 발달했다.
Y 염색체가 있으면 남성인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Y 염색체를 갖고도 여성의 외부 생식기와 자궁, 나팔관을 가진 여성들이 있다. 또 2만5000분의 1 확률로 X염색체만 2개 지닌 남성도 태어난다.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 (<탄생의 과학> 최영은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누군가는 성호르몬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흔히 에스트로겐은 ‘여성다움’을,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다움’을 담당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두 호르몬은 모든 성별에게서 분비되고, 분비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호르몬이 얼마 이상이어야 여성/남성이라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우습다. 성호르몬도 아니라면 뇌가 다르게 생긴 걸까? 뇌 발달에는 환경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또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성기의 생김새, 생식세포의 생산 유무, 염색체, 성호르몬, 뇌, 그 어떤 것도 성별을 똑 부러지게 구분하는 기준으로 부족하다. 이쯤 되면 왜 사람은 어떤 하나의 성별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구분되기를 강요받는지 의문이 생긴다.
스스로 인식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또 그런대로, 자신의 성별을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여성으로 살고자 했던 이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내 마음은 여전히 침잠(沈潛) 중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존중도 없이 단순하게 여자/남자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은 법과 제도는 이제 그만 허물어지면 좋겠다. 더는 귀한 생명이 스러지지 않도록.

